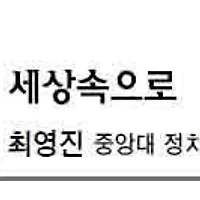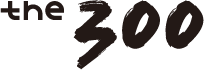
[뷰300]'시베리아' 나선 정동영의 세번째 '1월11일'
[the300]DJ가 손잡아 이끈 정치입문…19년 뒤 야권 신당 승부수
2015.01.02 the300 김성휘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과 신당합류를 밝히고 있다.
2015.1.11/뉴스1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대선후보까지 지낸 그가 다시 탈당했다. 1월11일. 숫자 1이 세 번 겹친 것도 인상적인데, 정동영의 '1월11일 승부수'는 이번이 세번째다.
시간을 19년 거꾸로 돌린 1996년 1월11일.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40대 남성의 손을 잡고 당사 기자실에 들어섰다. DJ가 직접 소개할 만큼 영입에 공을 들인 남자, 정동영이었다. MBC를 그만둔 '인기앵커' 정동영은 그날 입당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에 이르기까지 '젊은 피'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걸로 정평이 났다. 필생의 라이벌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재영입 경쟁도 벌였다. 그런 DJ였지만 영입대상자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으로 동행한 것은 당시까지는 전례없던 일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기억이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전당대회가 1월11일이었다.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 전대에서 초대 당의장에 정동영 의원을 선출했다. 참여정부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던 인물 DY(정동영 이름의 영어 이니셜)가 명실공히 집권여당 대표로 탄생했다.
정 전 고문은 묘하게 겹치는 1월11일의 인연에 대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96년엔 정권교체에 벽돌 한 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회의) 입당 8년 되는 날 2004년 당 의장이 됐고 당시 46석의 당을 17대 총선 결과 152석 과반여당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세번째 '1월11일'에 대해 "앞서 두 번은 모두 성공했다"며 성공의 기억을 강조했다. 고향 전북에 출마한 96년 총선에서 전국최다득표율로 국회의원이 됐고, DJ는 이듬해 199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았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지금의 새누리당(158석)과 비슷한 규모의 과반 여당이 되면서 승승장구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연설하는 정동영 전 고문/뉴시스
그런데 배우든 정치인이든 한 때를 휩쓸던 인기스타도 세월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다. 1월11일과 승리의 추억도 이제 지난 일이 된 것은 아닐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10년 집권기는 정치인 정동영의 황금기와 일치한다. 열린우리당은 "명멸하는 정당이 아니라 백년정당이 될 것"이란 구호가 무색하게 참여정부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해체됐다. 그는 우리당을 사수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당이 사라지기 전 탈당했다.
자신이 후보로 나섰던 2007년 대선패배 후 언제나 '벽'에 부딪치는 도전을 감행했지만 결과는 실패. 게다가 세번째 1월11일은 탈당선언이다. 탈당은 흔히 "한겨울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뛰쳐나가는" 일로 불린다. '국민모임'의 신당 추진이 가속화됐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탈당으로 판을 바꿀지, 이미 바뀐 판에 '잊혀진 스타'로 남을지는 단정 못한다. 분명한 건 정 전 고문이 큰 숙제를 받아들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가 아니라, 자신이 간절히 호출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펴길 기대한다. 최소한 1월11일이 자신에게만 의미있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다.
"양극화의 심화로 갈수록 고통 받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은 누가 대변해야 합니까.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줘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모임'이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정동영 탈당 기자회견)
'Dy's team > Today's DY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동영 “국정원 대선개입, DJ라면 그냥 안 넘어갔을 것” (0) | 2015.01.19 |
|---|---|
| 정동영의 탈당과 진보신당의 바람 (0) | 2015.01.16 |
|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치판 행운아’서 ‘담대한 진보’로 (0) | 2015.01.12 |
| 정동영 “정의당과도 협력” (0) | 2015.01.12 |
| 심상정 “정동영 탈당, 야권 혁신 경쟁의 물꼬 트는 계기돼야…” (1) | 2015.01.12 |